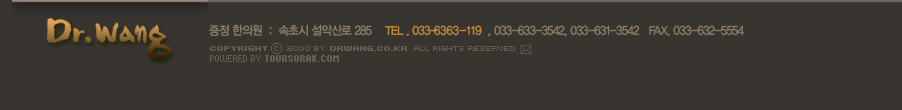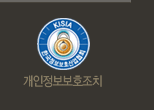|
옛날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했을까.
서양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전통의 접골술에
대하여 많이 잊혀진 것 같다.
60년대 서울 광화문에서 서대문
가는 거리에 접골원이 많았다는
것이 기억난다. 이젠 골절상을
당하면 당연히 양방 정형외과에
가게 된다.
접골이란
말은 부러진 뼈를 접해준다는
뜻이다. 한의학에서 접골술의
역사는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의학에서 가벼운 골절상에는
접골을 하여 깁스를 하고 여러
조각난 뼈는 외과 수술을 통해
1차로 뼈를 제자리에 고정시킨
뒤 깁스를 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도
1차로 부러진 뼈를 교정하고 뼈를
빨리 굳게 하는 한방고약을 두껍게
바른 후 대나무 혹은 낙엽송나무로
만든 발로 환부를 고정시킨다.
내복약으로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과 빨리 굳게 하는 약물을 병행하여
환자에게 투여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부러진
뼈를 치료했다. 어렸을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한의학책을
읽다가 우연히 접골에 대하여
보게 됐는데, 이책에 기록되어
있는 뼈를 빨리 굳게 하는 고약처방을
발견하고 어린 나이에 하도 신기해서
처방대로 고약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실험 대상이 없어, 좀 잔인한
생각은 들었지만 궁리 끝에 닭을
갖고 실험해 봤다.
닭의
두 다리를 다 부러뜨린 후 한쪽
다리에는 만들어 놓은 고약을
붙이고, 대나무를 쪼개어 고정시킨
후 붕대를 감았다. 다른쪽 다리는
그냥 대나무로 고정시킨 후 붕대를
감았다. 한 1주일쯤 되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고약을 붙인 쪽
다리와 붙이지 않은 쪽 다리를
비교해 보니 고약을 붙인 다리가
훨씬 더 굵게 자라나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의학은
우리의 전통의학이며 민족의학이다.
이제 민족의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껴야 한다.
|